[스크랩] ※임진왜란 최초 의병, 누군지 정확히 아십니까 ※
경상남도 김해시 송담서원 사충단.
 |
▲ 사당과 사충단을 제외한 송담서원 전경. 송담서원의 사충단은 1592년 4월 20일 김해성 전투 때 왜적에 맞서 싸운 송담 송빈 등 네 분의 충신을 기려 세워진 기념물이다. |
그래서 겨울 배추부터 실험적으로 재배해봤다. 빈 밭 한쪽 구석에 배추씨를 뿌렸고, 싹이 트는
길로 포기마다 기름 먹인 창호지를 정성 들여 씌웠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자 놀랍게도 배추는
김장감으로 쓸 수 있을 만큼 튼실하게 자랐다. 용기를 얻은 그는 11월 들어 고추, 오이, 가지 등
의 겨울 재배도 시도했다. 마침내 그 이듬해에는 기둥을 세우고 두터운 비닐을 씌운 이른바 '비
닐 하우스 농사'를 국내 최초로 시도해서 성공했다.
비닐하우스 농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김해
뿌리깊은나무가 1983년에 펴낸 <한국의 발견>은 박해수 농부의 실험 정신을 두고 '(우리) 나라
영농 기술의 혁명'이 됐다고 평가한다. 채집 생활을 하던 구석기 시대를 벗어나 사람들이 처음
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일을 두고 '신석기 혁명'이라 하듯이, 비닐하우스 농법의 개발은 우리
나라 농업의 신세계를 연 혁명으로 인정해야 할 정도로 훌륭한 업적이었다는 뜻이다.
 |
▲ 송담서원 강당 지붕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김해시의 풍경. 지평선으로 느껴지는 곳이 허황옥이 배를 타고 나타났던 낙동강 하구 남해 바다이다. |
|
김해로 몰려온 적군은 일본군 제3군이었다. 가장 먼저 상륙하여 부산진과 동래성을 함락시킨
소서행장의 약 1만8700여 제1군은 중군이 되어 밀양으로 올라가고, 뒤이어 뭍에 오른 가등청정
의 약 2만8800여 제2군은 동로를 맡아 경주를 향해 북상했다.
흑전장정의 약 1만3000여 제3군은 서쪽으로 진입, 김해를 공격했다.
왜적이 쳐들어 왔다는 소문만 듣고도 조선군은 무너졌다
1592년 4월 13일 <선조실록>은 '(적이 밀려오자 경상좌도) 병사 이각은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달아났다, 200년 동안 전쟁을 모르고 지낸 백성들이라 각 군현(郡縣)들은 풍문만 듣고도 놀라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김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투를 지휘해야 할 수령 김해부사와
부장격인 초계군수는 승산이 없다 싶자 제각각 줄행랑을 쳤다.
 |
▲ 김해읍성의 일부가 2008년 복원되었다. 성문 중 유일하게 복원된 북문 아래 그늘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쉬고 있는 모습. |
| ⓒ 정만진 |
임진왜란 최초 의병에 대한 기록은 1592년 6월 1일 <선조수정실록>에 실려 있다. 실록은 '여러
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당시 삼도(三道,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장수와 관리들이 모두 인심
을 잃은 데다가 변란(임진왜란)이 일어난 뒤 군사와 식량을 징발하자 사람들이 모두 밉게 보아 적
을 만나기만 하면 모두 패해 달아났다. 그러다가 (중략) 호남의 고경명·김천일, 영남의 곽재우·정
인홍, 호서(충청도)의 조헌이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다(最先起兵)'라고 말한다.
고경명, 김천일, 곽재우, 정인홍, 조헌이 처음 창의
이 기록은 '국가의 명맥이 의병들 덕분에 유지되었다(國命賴而維持)'면서도 '(의병들은) 크게
성취하지 못했다(不得大有)'라는 사족을 달고 있어 후대 독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또,
4월 22일 창의한 곽재우만 특칭하지 않고 고경명, 김천일, 정인홍, 조헌을 함께 말하고 있는 까
닭에 최초 창의에 대한 명확한 단정은 되지 못한다.
 |
| ▲ 김해읍성 북문과 그 앞의 옹성(왼쪽의 둥근 성벽) |
ⓒ 정만진 |
또 김성일은 '(경북) 고령의 김면, (경남) 합천의 정인홍이 그의 동지인 (경북) 현풍의 곽율, 박
성, 권양 등과 더불어 향병(鄕兵, 의병)을 모집하니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라면서 '인홍은 정
예병이 거의 수백 명이며 창군(槍軍, 창을 사용하는 군사)은 수천 명이나 되는데 고을의 가장(假
將) 손인갑을 추대하여 장수로 삼아 왜적을 방어할 계책을 세우고 있고, (경남 합천) 삼가의 윤탁,
노흠도 의병을 일으켜 서로 응원하려고 합니다, 김면은 스스로 장수가 되어 바야흐로 병사들을
모집하는데, 적병들이 갑자기 쳐들어오자 병사들을 거느리고 나가 싸우니 왜적들이 패전하여 달
아나므로 10여 리를 추격하여 거의 큰 승리를 거두려는 찰나에 복병이 갑자기 나타나 퇴각하였습
니다'라고 승전 소식도 보고한다.
4월 21일 대구 함락, 4월 22일 곽재우 창의
곽재우가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다는 내용은 그 뒤에 이어진다. 김성일은 '(경남) 의령 곽월의
아들 곽재우는 젊어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연습했고 집안이 본래 부유하였는데, 변란을 들은 뒤
에는 그 재산을 다 흩어 병사를 모집하니 수하에 장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라면서 그가 '가장
먼저 군사를 일으켰습니다(最先起軍)'라고 증언한다.
김성일은 이때 이미 적들이 곽재우를 "홍의장군(紅衣將軍)"이라고 불렀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전
한다. 그의 장계에 따르면, '(곽재우가) 의령현의 경내 및 낙동강 가를 마구 누비면서 왜적을 보면
그 수를 불문하고 반드시 말을 달려 돌격하니, 화살에 맞는 적이 많아서 그만 보면 바로 퇴각하여
달아나 감히 대항하지 못했다.' 그래서 왜적들은 "이 지방에는 홍의 장군이 있으니 조심하고 피해
야 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
▲ 송담서원 사당 서쪽의 사충단. 임진왜란 초기 김해성 전투 때 의병을 이끌고 왜적과 싸우다 장렬히 순국한 송빈, 이대형, 김득기, 류식 네 분을 기려 세워졌다. |
| ⓒ 정만진 |
4월 14일의 부산진성과 그 이튿날인 15일의 동래읍성은 첨사 정발과 부사 송상헌이 관군을 지
휘하며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공격을 받고는 그날 바로 일본군에게 점령당했다. 숱한 일반 백
성들이 수령을 도와 왜적과 싸우다 순절했지만, 수령의 지휘를 받아 전투를 치렀으니 창의는
아니다. 그 두 가지 점에서 김해 의병은 다르다.
관군 없이 싸운 최초의 의병 단독 전투 김해읍성 싸움
김해 의병은 관군 없이 싸웠다. 하루만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흘 동안 줄기차게 싸웠다. <합천
군지>는 '4월 17일에서 20일까지 4일 간에 걸친 김해성 싸움은 순수 의병과 의병 지휘자만으로
왜군과 싸운 임진왜란 최초의 격렬한 전투로 기록됐다. 더욱이 관군으로 버티던 부산과 동래가
하루만에 무너진 데 반해 비록 왜군의 한 부대였다 해도 수나 장비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적과
대결하여 나흘 동안이나 버텼다는 것이 놀랍고, 특히 이후 7년 간에 걸친 싸움에서 의병의 효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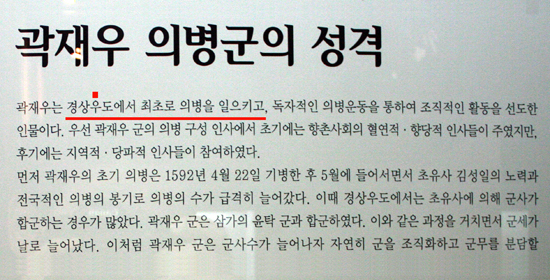 |
▲ 경남 의령 의병박물관의 <곽재우 의병군의 성격>이라는 게시물에는 '곽재우는 경상우도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키고'라는 표현이 있다. '나라 안에서 최초 의병을 일으키고'가 아니다. |
|
나흘 동안이나 일본군을 막은 김해 의병들, 전쟁의 흐름 바꿨다
대구는 김해 의병의 장렬한 전투가 전쟁의 흐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 알게 해주는
지역이다. 대구읍성이 4월 21일 일본군에게 점거되자 대구부민들은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버렸
다. 결국 대구 선비들은 7월 6일이 되어서야 팔공산 부인사에 본부를 차려 의병 부대를 일으킬 수
있었다.
김해 의병이 없었다면 경상우도 일원의 여러 창의들 또한 그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는지 모른다.
임진전란사에 큰 족적을 남긴 홍의장군의 위대함을 낮추려는 의도는 결코, 조금도 없다. 다만 김
해 의병들의 업적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비닐하우스의 농민 박해
수가 텅 빈 김해의 겨울 들판을 안타까워 했듯이.
 |
| ▲ 송담서원의 강당. 사당과 사충단은 강당 뒤 좀 더 높은 곳에 있다. |
| ⓒ 정만진 |
19일 하루 내내, 잠깐도 그치지 않고 전투가 계속되었다. 수백 명에 불과한 의병들이었지만 하
루 낮은 간신히 버텼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적들은 성 주변은 물론 들판의 보리까지 모두 베어
와 높이 쌓고는 성 안으로 넘어 들어왔다. 1만3000여 명이 되는 숫자의 힘이었다.
1만3000여 일본군, 김해들판에서 베어온 보리 쌓아 밟고 성벽 넘어
이튿날인 20일, 성은 결국 중과부적을 이겨내지 못하고 함락되었다. 적들은 투항을 권고했지만
네 사람은 몇 명밖에 남지 않은 의병들과 함께 끝까지 적들 한가운데에서 싸우다가 전사했다.
수백 의병들도 모두 죽었다.
며칠 뒤, 송빈의 군사 양업손(梁業孫)이 시쳇더미 속에 파묻혀 있다가 살아나와 김해읍성의 장
렬한 참상을 세상에 알렸다. 그 덕분에 네 충신들은 전란이 끝난 1600년(선조 33) 병조참의 등
벼슬을 추증받았다. 하지만 그뿐, 다시 역사 속에 묻혔다.
1708년(숙종 34), 이순신의 현손 이봉상이 김해부사로 와서 <금주지(金州誌)>를 보다가 김해읍
성 전투의 전말을 알고 감격했다. 그가 나서서 조정에 건의한 끝에 송담서원이 건립되었다. 1833
년(순조 33)에는 표충사(表忠祠) 사액도 받았다. 그 후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을 맞아 훼철되
지만 1871년(고종 8) 김해부사 정현석 등의 상소에 힘입어 사충단(四忠壇, 경상남도 기념물 99호)으로 다시 태어났다. 현재의 서원 건물들은 1995년에 복원된 것이다.
 |
| ▲ 외삼문과 서재 중간 지점에서 바라본 송담서원 전경. 사진의 맨 오른쪽 건물이 동재이다. |
길만 조금 가다듬어진다면, 송담서원의 위치는 아주 좋다. 김해시 전역을 발 아래 거느린 고
지대인 덕분에, 멀리 수평선인 듯 지평선인 듯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파르라니' 가로로 이어
지는 원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무엇보다도 서원 경내가 넓은데다 잡다한 건물이 없어 시원
하고,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의 높낮이가 뚜렷하여 전체적으로 웅장하다.
사충단은 강당 뒤 한참 높은 곳에 사당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서 있다. 그래도 사당보다 더 산
쪽에 붙어 있는 사충단이 외삼문에서 볼 때 가장 높고 먼 곳에 자리잡고 있다. 사충단의 네 분
께 참배를 올리며 잠깐 묵념을 한다. '임진왜란 때 살았더라면 김해 의병들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치고 지나간다. 어쩐지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아무도 보는 이
없건만, 저 멀리 바다 쪽을 공연히 응시한다.
네 분의 충신들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까
저 아래 넓은 김해평야는 임진왜란 당시 들판이 아니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김해평야
일대가 모두 바다로 나온다. 사충단의 네 충신들은 저곳 가득 메워진 일본군의 전선들을 보았
는데, 나는 지금 곡식들로 가득찬 들판과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들을 보고 있다. 역시 나는 김해
의병들과 아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어느덧 서원이 문을 닫을 시간이다.

| ▲ 송담서원의 저물 무렵 전경 |